임차인 계약해지 당했다면 해결 방법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열심히 영업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게 운영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러한 요구는 무리하게 느껴질 것 입니다. 과연 임차인은 점포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느냐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를 들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는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하며 투자하는 자본이 적지 않으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상가임대차법으로 장기 임차를 도모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의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 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어 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재계약된 임대차에 한해서 10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영업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신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태라면 건물주에게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분쟁 상황을 대비해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요청을 하거나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라면 영업을 종료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간 쌓아온 영업의 가치를 회수하고 운영하던 가게는 명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포함한 이러한 영업 가치를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3개월 치 월세를 미납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했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차인이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에 즉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에게 없을 때에 한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이 안된 세입자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매매, 재건축 또는 직접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작스러운 통보에 세입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임차인 L씨도 이러한 문제를 당면하고 상가변호사 닷컴에 의뢰해 주셨고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임차인 L씨는 서울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 L씨로부터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매각 및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 명도를 통보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임차하여 갱신은 불가능한 임차인 L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위임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사무소는 권리금 회수 협조에 대한 내용증명을 건물주 L씨에게 발송합니다. 임차인 L씨는 신규임차인 P씨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건물주 L씨에게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며 임차인 L씨는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건물주 L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 결과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임차인 L씨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법무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물주 L씨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 동시에 책임을 회피할 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가합니다. 마침내 2021년 4월 29일, 임차인 L씨와 건물주 L씨는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을 원상복구 후 점포를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건물주 L씨는 명도 합의금 1억 4천만 원을 임차인 L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툼이 종결됩니다.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무리하게 명도를 요구한다면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각 임대차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여 권리를 찾고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 대응하여 상황을 불리하게 이끌어 가기보다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 분쟁해결-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 월세 인상 한도 나에게도 해당될까 (0) | 2021.05.25 |
|---|---|
|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 전략은? (0) | 2021.05.21 |
| 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0) | 2021.05.14 |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정확히 알고 행사하기! (0) | 2021.05.12 |
| 상가 권리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5.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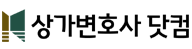




댓글